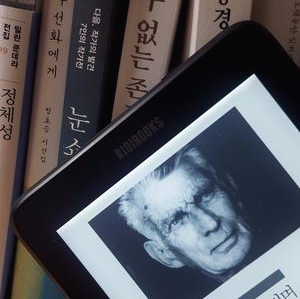왜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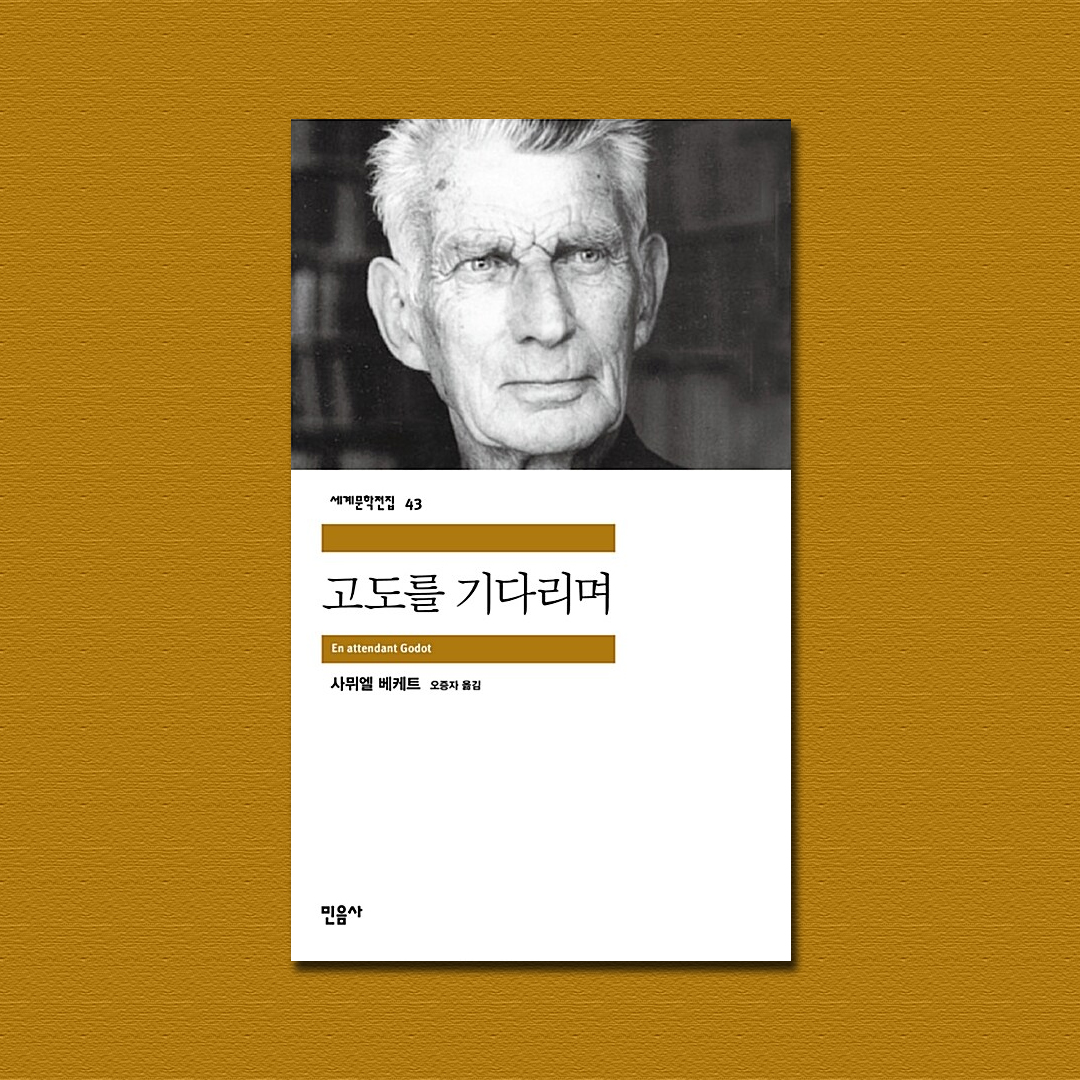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
_ 사무엘 베케트
기다림의 끝도 달콤하지만 사실 기다리는 시간에도 은은한 향이 난다는 것을,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저 먼 곳부터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그것’이 다가온다. 그것이 다가오면서 내뿜는 향기가 너무도 진하기 때문에,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할 수가 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잔잔한 향기가 달콤함으로 바뀌지 않을 때다. 아주 오랜 시간 기다리더라도 달콤한 것이 올 것 같지가 않다면? 그래도 기다려야만 할까?

기다리는 사람들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는 매우 정직한 희극이다. 부조리극 혹은 반연극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여겨지는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고도가 오기를 기다리며 달콤함을 맛보고자 하는 에스트라공(이하 고고)과 블라디미르(이하 디디), 두 남자의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다. 두 남자의 말들은 서로를 향하긴 하지만 동문서답의 향연으로 좀처럼 ‘대화’로 보이지 않으며,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제자리를 빙빙 돌다가 때로는 뒤로 돌아가버리는 것에 가깝다. 작품의 플롯과 개연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점들이 재앙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블라디미르 아니, 또 너로구나!
에스트라공 그래서?
블라디미르 다시 만나니 반갑다. 아주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에스트라공 나도 그래.
하지만 이 재앙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고도를 기다리며>의 진면모다. 반(反) 연극. 기존의 연극들이 사실적이고 감상적인 이야기 전개, 일관적이고 매력적인 인물상의 묘사 중심이었다면 이런 전통에 대한 반발로 비현실적이고 무미건조하면서 어떠한 흐름이나 정체성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다. 모든 예술 작품들이 독자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일련의 스토리텔링 부재와 두드러지지 않는 등장인물들의 성격, “고도가 누군지 알았으면 작품에 실었을 것”이라며 제목에도 떡-하니 적혀 있는 ‘고도’를 하나의 맥거핀으로 만든 작가의 말은 더욱 이 작품의 해석을 다채로운 방향으로 이끈다. 물론 베케트의 삶과 경험이 작품에 스며들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적어도 고도가 돌아올 것인지 돌아오지 않을 것인지, 이들이 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 다양한 해석의 선택지만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블라디미르 딱히 오겠다고 말한건 아니잖아
에스트라공 만일 안온다면?
블라디미르 내일 다시 와야지
에스트라공 그리고 또 모레도.

의미란 게 있긴 할까, 끝없는 기다림
고고와 디디를 수십 년 동안 한 공간에 머무르게 한 것은 고도를 향한 기다림이다. 그들은 오랜 기다림에 지쳐 나무에 목을 매다는 것까지 생각하지만 고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물론 그들의 이야기를 읽은 우리는 아마 고도가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음속으로 새기지만, 어쨌든 고고와 디디는 기다리고 있고 기다릴 것이며 기다려야만 한다.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종의 ‘반항’이니까.
이들의 기다림을 바라보면 ‘부조리는 곧 단절’이라는 카뮈의 말이 떠오른다. 묵묵히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과 그럼에도 오지 않는 고도의 사이의 단절! 자살을 생각해보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는 두 인간! 오랜 시간 오지 않는 고도를 향해 한 마디 욕조차 던질 수 없는 무기력한 두 사람은 하릴없이 떨어진 돌덩어리를 올려야만 하는 시지포스와 닮았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단 하나 확실한 게 있지, 그건 고도가 오기를 우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라는 디디의 말에서 굴어 떨어진 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시지포스의 잔상이 스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블라디미르 그럼 갈까?
에스트라공 가자.
둘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
말로는 이제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몸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 1막의 위풍당당하고 폭력적이었던 포조가 2막에서는 눈이 멀고 나약해진 한편에도 두 사람은 지독하리만큼 일관적이다. 앞에서 왜 고도는 오지 않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했다. 그렇다, 고도가 어떤 사람인지 왜 오지 않는 것인지, 더 나아가 이들이 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고고와 디디의 대화 하나로 필요성을 잃어버린다.
에스트라공 하지만 우린 약속을 받았으니까
블라디미르 참을 수가 있지
에스트라공 지키기만 하면 된다.
블라디미르 걱정할 것 없지
에스트라공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 자체로.
달콤함과 은은함 사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기다림에 대한 달콤함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하는 질문에 쉽게 정답을 내놓기란 어렵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혹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또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질문은 고도를 기다리는 두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질문이었던 것 같다. 나는 기다림의 목적과 종결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었으나 이들에게는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태까지 ‘기다림’이라는 단어 안에 반드시 달콤함이나 은은한 향기가 있다고 믿었다. 또 어떤 정답이나 종착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향기를 맡기 위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떠한 향기가 나지 않더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상관이 없었다. 때로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기다림도 있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미 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고고와 디디의 기다림에서 나는 ‘기다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하나 되새겨본다. 두 사람의 숭고한 반항에서 달콤하거나 은은한 향기는 아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느껴진다.